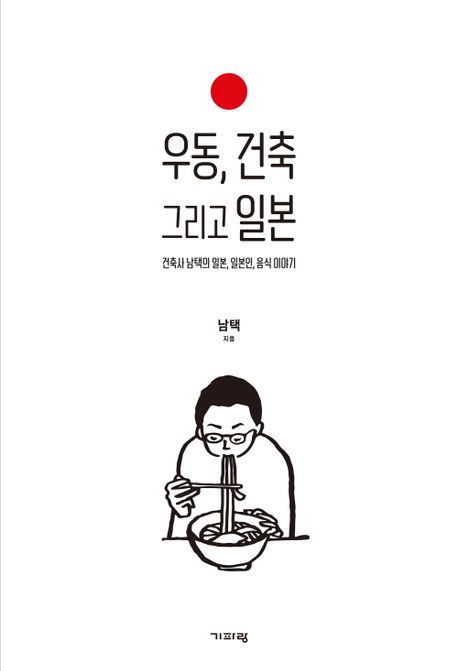
<우동, 건축 그리고 일본>의 저자 남택은 본래 건축학도였다. 그저 그런 건축사로 만족할 수 없다며, 서른살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맨손으로 일본에 갔다. 어학연수를 하며 목욕탕 청소, 종이컵 포장, 철거공사 현장 등 밑바닥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마침내 유명한 설계사무소에 들어가 현상공모에 가작으로 뽑히기도 했으나, 정직원이 아닌 모형제작 아르바이트 신분이었다. 건축사 자격은 결국 한국에 돌아와 취득했다.
노숙자의 ‘무릎 아래 눈높이’까지 경험한 일본생활은 그에게 천지개벽 같은 개안(開眼)을 안겨줬다고 한다. "‘전근대 조선인’이 ‘근대 한국인’으로 환골탈태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설계사무실에서 건축사로 일했던 경험, 일식집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 등을 소재로 소셜미디어(SNS)와 일간지에 칼럼을 연재해 왔다. 체험으로 녹여낸 일본견문록, 그의 첫 단행본 <우동, 건축 그리고 일본>은 일식당을 경영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된 일본·일본인, 그리고 음식·건축 에세이 모음이다.
일본을 자주 다니며 일본을 더 좋아하게 돼 그래서 더 자주 가는 사람, 말로 일본을 미워하고 욕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일본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저자는 두 가지 부류의 전혀 다른 지일(知日)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 책엔 일본을 좀 다녀본 사람이면 ‘맞아 맞아’ 끄덕일 소소한 경험담과 깨달음이 그득하다. "일본은 밉지만 배울 건 배워야 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볼 만하다(기파랑 출판, 344쪽).
백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