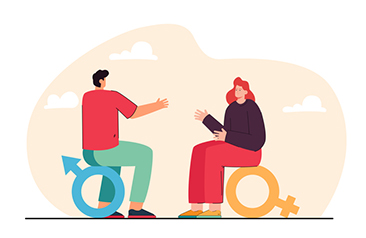
우리말 ‘그’ ‘그녀’는 100년 전쯤 서구의 인칭대명사(he·she, er·sie, il·elle 등), 그리고 그것의 일본어 번역을 접하며 등장했다. 요즘 구어에선 ‘그이’ ‘그여자’ 혹은 남녀 구분 없이 ‘그분’이라 지칭하곤 한다. 1920년대 신문화운동기 김동인이 ‘그’를 인칭대명사로 쓰기 시작했다(나중에 그·그녀로 구분). 비슷한 시기 염상섭은 일본어 ‘彼’ ‘彼女’를 우리말 발음한 ‘피’ ‘피녀’라고 썼다.
19세기 중후반 일본에서 서구 언어들을 번역하다 ‘kare彼’ ‘kanojo彼女’가 태어난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들이 3인칭대명사 기능보다 사실상 ‘1인칭 주어’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문학의 언어’일 때 특히 그랬다. 원래 일본어에서 ‘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책은 내 거야." 이 문장의 우리말 ‘그’처럼 지시대명사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게 외국어와의 교섭 속에서 질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살고 있다’라는 소설 제목이 있다. 여기서 ’그녀‘가 3인칭대명사 she에 해당하는 듯하지만 실은 ‘고유명사’에 가깝다. 어떤 특정 존재를 의미한다. 너무 어렵게 들린다면, 자기자신을 ‘그’ ‘그녀’로 놓고 글을 써보라. ‘자기를 객관화한 주인공’이 태어나게 된다. 영어의 he·she란 앞에 나온 고유명사, Mary니 Robert 등을 대신하는 말일 뿐이지만, 번역어 ‘彼’‘彼女’, 또 그것의 우리말 번역어 ‘그’ ‘그녀’는 ‘나’를 객관화시키는 뜻밖의 효과를 낳았다. ‘나’, 근대적 자아의 발견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녀’가 일본어 잔재라며 쓰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말’ ‘문자’를 갖췄다 해서 다 문학어·학술어가 되진 않는다. 선진 지역, 이(異)문화 언어들과 접촉해야 한다. 고급 언어들은 예외 없이 ‘번역’을 통해 발전했다. 새로운 어휘·문법·레토릭과 함께 표현력도 성장한 것이다. 풍부하고 정밀하며 혼동의 여지가 적을수록 좋다. ‘그’ ‘그녀’ 다 쓰는 이점을 버릴 까닭이 없다.

